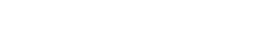한민족의 국통맥
‘조선’ 이라는 나라 이름의 의미
이성계의 등장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원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원의 쌍성총관부 다루까치였던 울루스부카(吾魯思不花)이다. 즉 이성계는 출생 국적이 원나라인 것이다.
환조의 배위는 의비 최씨이니, 증문하시중(贈門下侍中) 영흥 부원군(永興府院君) 시호(諡號) 정효공(靖孝公) 최한기(崔閑奇)의 딸이다. 지원(至元) 원년, 고려 충숙왕(忠肅王) 4년 을해 10월 11일 기미에 태조(太祖)를 화령부(和寧府) 【곧 영흥부(永興府)이다.】 사제(私第)에서 낳았다. 태조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우뚝한 콧마루와 임금다운 얼굴[龍顔]로서, 신채(神彩)는 영특(英特)하고 준수(俊秀)하며, 지략과 용맹은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어릴 때 화령(和寧)과 함주(咸州) 사이에서 노니, 북방 사람들로서 매[鷹]를 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성계(李成桂)와 같이 뛰어나게 걸출(傑出)한 매를 얻고 싶다.” 하였다.
-『태조실록』1권, 총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려말도 할 줄 알았겠지만, 몽골 말을 더 잘했을 것이다. 그런 이성계가 고려에 들어오게 된 것은 고려의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전격적으로 시작된 고토를 되찾는 과정에서, 자비령 서쪽은 당연히 포함되었고 당시 쌍성총관부의 내부 불화로 편갈이가 되었는데,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고려 편에 서면서 고려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공을 바탕으로 고려는 대부분의 땅을 회복하였고, 이자춘은 고려로 다시 귀순하면서 그의 아들 이성계는 고려 정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성계는 고려 동계의 옥토인 화주를 근거지로 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말 여러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의 이런 실력 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였고,(이때 정도전도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일약 고려의 최대 군벌이 되었다. 그의 이런 세력 확대는 결국 전라도에서 침략을 일삼는 왜구들을 무찌르고 나서 전주에 돌아와 여러 부하들과 잔치를 하면서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훗날 전주를 풍패의 땅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던 이성계는 고려에서 명령한 요동정벌을 거부하고 중간에 군사를 돌려 고려에 창 끝을 들이대면서 문제는 복잡하게 되었다. 그는 고려의 모든 권한을 잡으면서 전날 전주에서 말하던 새 세상을 열기 위한 뜀박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원래 학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큰 꿈을 꾸던 참모들의 말을 잘 들었다. 더구나 그가 새 세상을 여는 일을 주저하던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정도전을 비롯한 사람들이 맹자의 ‘역성혁명론’으로 설득을 시키자 명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는 1392년에 왕씨의 왕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고려의 왕위에 올랐다.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고려의 왕위에 오른 것이다. 즉 고려의 왕이 왕씨에서 이씨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현재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명에 고려 국왕의 이름으로 사신을 보냈다. 명의 홍무제는 고려 국왕의 옥쇄가 찍힌 국서를 보고 노발대발하며 나라 이름을 바꾸도록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홍무제는 고려가 명과 대등하게 맞짱을 뜬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아직 요양지역이 어느 나라 영토로 귀속이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방의 가장 큰 적이었던 고려라는 국새가 찍힌 문서를 보았을 때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다.
‘조선’의 유래
명으로부터 나라 이름을 바꾸라는 공문을 받자 이성계는 바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의 시작이 조선 시대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 스스로 바꿨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만대에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고려 조정은 고민 끝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화녕’, ‘조선’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보냈다. 이 두 이름의 속내를 뜯어보자면 ‘화녕’은 이성계의 고향인 현재 중국 길림성 송화강 동부지역을 말하는 것이니 고려의 땅을 말하는 것으로 넓게는 현재 중국의 길림성, 요녕성을 아우르는 의미도 있는데 즉 그의 세력권이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조선’이라는 말은 고려 역사를 볼 때 고려의 시조격인 나라로 이 땅에서 대대로 이어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때 많은 관리들은 조선을 기자와 관련하여 조선이라는 이름을 짓자고 하였다. 여기에는 정도전도 포함이 된다.
성인이 왕통을 창시하였으니 문득 기자의 옛 봉토를 다스리었으며, 황제의 명령이 아름다웠으니 조선(朝鮮)의 미호(美號)를 주었습니다. 종사에 영광이 오고 신민(臣民)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순제(舜帝)의 문명(文明)보다 뛰어났으며, 탕왕(湯王)의 용지(勇智)에 필적(匹敵)하셨습니다. 구가(謳歌)의 따른 바에 순응하고 역수(曆數)의 돌아온 바를 받아서 하민(下民)을 다스리는 인덕(仁德)을 미루어 넓히고, 대국(大國)을 섬기는 예절에 더욱 근실히 하셨으니, 한 장의 종이에 열 줄 되는 조칙이 먼저 그 이름을 바루게 하였으매, 억년 만년의 기업(基業)이 지금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신 등은 성상의 병위(兵衛)를 모시지 못하여, 비록 빨리 달려가는 반열에 나아가지 못했사오나, 즐거이 도성(都城) 사람들과 더불어 연하(燕賀)의 정성을 갑절이나 다 하겠습니다.”
-『태조실록』3권, 태조 2년 2월 15일 경인 2번째 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 이름이 조선이 된 것이고, 고려왕 이성계는 조선의 태조가 되는 것이다. 즉 고려의 마지막 왕은 이성계인 것이고, 그가 곧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조선의 태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의 유래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와 관련하여 지은 이름이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명에 보내는 공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배신(陪臣) 조임(趙琳)이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삼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황제의 칙지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번 고려에서 과연 능히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를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소방(小邦)은 왕씨(王氏)의 후손인 요(瑤)가 혼미(昏迷)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 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국사(權知國事)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國號)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國號)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小臣)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등의 칭호로써 천총(天聰)에 주달(奏達)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재가(裁可)해 주심을 바라옵니다.”
처음에 임금이 사신을 보내고자 했으나 그 적임자를 어렵게 여겼는데, 상질(尙質)이 자청하여 아뢰었었다.
-『태조실록』2권, 태조 1년 11월 29일 병오
이 내용 어디에도 기자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만약 조선에서 기자와 관련하여 나라 이름을 지었다면 반드시 넣었어야 할 내용인데 없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태조실록』에는 나라 이름을 짓는 과정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있지만, 태조의 신도비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신도비는 태조가 죽고 나서 6년 후에 태종이 세웠는데, 그 비문은 권근이 지었다. 이 신도비문은 처음 권근이 지었지만 짓고 나서 얼마 후에 죽자, 그 비문을 토대로 성석린이 다시 수정을 하여 새기게 된다. 그러므로 원문과 교정본은 내용이 일부 다르다. 그러므로 신도비문을 소개하는 내용은 먼저 권근이 쓴 것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성석린의 교정본을 소개하도록 한다. 먼저 권근의 원본이다. 원본의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변도십팔자(九變圖十八子)의 전설이 단군(檀君) 때부터 있어 수천 년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징험할 수 있다.
② 또 이승(異僧)이 지리산(智異山) 석굴로부터 이상한 책을 얻어 가지고 와 드렸는데, 거기에 씌어 있는 말이 위에서 말한 바, 단군 시대에 나왔다는 것과 서로 부합되니, 이 또한 광무(光武) 때 있었던 적복부(赤伏符)의 유와 참위(讖緯)의 설로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하겠으나, 역시 간혹 이수(理數)가 있어 옛날부터 여러 번 징험되었다. 하늘이 덕 있는 이를 돌봄은 진실로 징험이 있는 것이다.
-권근
①의 기록을 보면 ‘이(李)’를 파자한 ‘십팔자(十八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미 수 천년 전인 단군 때부터 예언이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단군’이라는 특정인이 거명되는 것이다.
②의 기록을 보면 지리산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역시 단군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전해줬다는 기록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곧이 곧대로 믿을 바는 못되나 그래도 징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꼭 못 믿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조선의 나라 이름을 국조격인 ‘단군’과 관련을 두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조선의 정통성은 기자가 아니라 단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문의 내용이 권근이 죽고 나서 성석린에 의하여 바뀌게 된다.
“지리산(智異山) 바위 틈에서 얻은 것인데 ‘목자(木子)가 삼한을 고쳐 바로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하였다. 사람을 시켜 나아가 맞으려 하니 이미 가버리고 없어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서운관(書雲觀)에 예전부터 비장하여 오던 비기(祕記) 가운데 구변진단도(九變震檀圖)에는 '나무를 세워 아들을 얻는다.[建木得子]'는 말이 있다. 조선이 곧 진단(震檀)이라는 말은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에 이르러서야 징험(徵驗)되니, 하늘이 덕 있는 이를 돌보고 도와준다는 것은 진실로 믿을 만한 것이다.
-성석린
비석에 새겨진 내용인데 권근의 원문에서 말하였던 ‘단군’이라는 말이 없어졌고, 다만 ‘진단(震檀)’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런데 역사의 범위는 넓어졌다. 성석린의 본뜻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림잡아 볼 때 단군 이전부터 역사를 넣은 것인 것 같기도 하다. 즉 권근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두 비문 모두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을 ‘환왕(桓王)’이라 하면서 이성계의 정통성을 환왕으로 보았다. 또한 이 두 비문에는 어디에도 기자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기자와는 상관없이 그 나라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우리는 흔히 유학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던 조선에서 왜 나라 이름과 관련하여 단군과 관련을 시키고,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을 추증할 때 ‘환왕’ 혹은 ‘환조(桓祖)’라 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환왕에 대해서는 이색이 쓴 묘비에 자세히 적혀 있고, 다시 정총이 지은 정릉비에 그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어쩌면 성석린이 말했던 것이 이 대목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권근의 원본이나 성석린의 교정본이나 직·간접적으로 단군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유추해보면 나라 이름은 조선이 되고, 이 나라의 왕은 단군이 되는 것이다. 즉 이성계도 단군이 되고 싶었거나 혹은 단군의 의미를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자춘을 환왕이라 한 점을 둘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나오는 고조선건국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조선의 기틀은 환웅이 잡았고, 그 기틀 위에 단군이 고조선의 왕으로 즉위한 내용과 비슷하다.
기자조선이 나오게 된 배경
이렇게 지어진 ‘조선’이라는 이름이 어느날 기자와 관련되어진 것이다. 이성계가 왕으로 오르는 명분을 만든 이들은 고려말 낮은 자리의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흔히 ‘신진사대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 필자의 생각은 이성계를 올린 사람들은 ‘성리파(性理派)’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필자가 정의하는 유학파는 하늘의 명을 받은 왕을 중심으로 철저한 신분제를 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신분마다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주가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 정의의 활용 범위는 국내이다. 성리파들은 유학적인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하늘의 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늘이 되어 천하를 한 집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착한 것이며 나의 편이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적이므로 응징을 해야 한다.
이런 성리의 논리가 만들어진 것은 송의 후기부터였다. 5대라는 혼란기를 평정하면서 세운 송은 군사력을 제어하면서 경제 중심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북방 민족인 거란의 공격을 받고 황하 이북 땅을 내줘야 했고, 이어 금의 공격으로 회하 이북까지 내줘야 했다. 이런 엄청난 혼란은 송의 관료와 선비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돈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돈과 물자로 북방 민족들을 달래 보았지만, 더 요구를 하거나 무력까지 동원하여 위협을 하자 송도 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망을 다니면서 정신승리를 위한 방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방법은 국내적인 틀인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송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이 하늘은 하늘아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야 일시적으로는 북방 민족들에게 굴욕을 당하였지만, 굴욕을 준 북방 민족들 역시 하늘 아래 것들이기에 송황제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논리였다. 기가막힌 정신승리였다. 이런 그들의 생각은 머지않아 몽골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크나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그들이 멸시하던 북방민족의 황제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하자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한(漢)’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서한이 일어난 현재 강소성 일대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송에서 만든 천하사상은 곧바로 몽골에서 활용되었다. 몽골이 나라 이름을 세상의 으뜸이라는 ‘원(元)’으로 바꾸자, 싫든 좋든 이 틀에서 관리를 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은 현재 중국의 동북 3성도 그들의 역사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원의 동령로(현재 중국 요녕성 요양지역)는 원래 고려의 땅이었는데, 고려의 반역자들이 자비령 서쪽의 땅을 원에 바치면서 원의 땅이 되었다. 송을 점령해 땅을 차지하고 동시에 원이 가지고 있던 북방 민족들의 하늘 존중 사상과 송의 성리학이 맞아 떨어지면서 원의 모든 땅에는 원의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대주의가 퍼지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자가 죽고 천여 년이나 지난 후 쓰여진 믿기 어려운 책에서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기록 한 줄로 한국 역사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곳이 기자로 덮이게 되었다. 이런 기록을 현실 정치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고려 사람은 아마도 안향, 이곡과 함께 당대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送李中父使征東行省序
蓋蘇文後少武事, 漬溝樓下有書聲
貢士來經鴨緑遠, 登科去被牙緋榮
中朝分命新詔使, 東人爭訝舊儒生
德音宣布聲教廣, 遣子入學同趨京
-『연석집(燕石集)』, 원나라 송경(宋褧)의 문집
送李中父使征東行省序
箕子餘風二千載, 幘溝樓下有書聲
貢士來經鴨綠遠, 登科去被牙緋榮
中朝分命新詔使, 東人爭迎舊書生
德音宣布聲敎廣, 遣子入學同趨京
-『가정집』 「가정잡록(稼亭雜錄)」, 이곡의 문집
이곡은 원에서 관리를 마치고 고려의 관리로 임명이 되어 돌아오는 길에 원의 한림학사 송경이 작별하는 시를 써주었는데, 그 시에 쓰여진 ‘연개소문’을 ‘기자’로 바꿀 정도로 이미 생각은 사대주의로 물들어 있었다. 이곡은 원의 그늘에 들어가기를 주장하였고, 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려의 원수인 원을 치기위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명을 활용하기 위하여 명의 그늘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패들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성계는 당연히 친명쪽으로 기우는데 그 이유는 그 자신이 몽골을 배신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성계로서는 친원파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곧 그의 정치생명에도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친명파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는 그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만주 전장에서 싸운 것은 몽골군이었다. 그런 이성계가 친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성계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의 작은 힘으로 원나라를 대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이 그 역할을 해주면 더 없이 고마웠을 것이다. 명이 몽골을 공격하면 그의 숨통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을 공격하라는 우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 이성계의 입장에서 명을 공격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이성계는 결국 명과 결탁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명과의 줄을 대는 정당성으로 기자가 주의 임명으로 조선왕이 되었다는 논리를 세우게 되었다. 이런 최초의 주장자는 어쩌면 이곡이었고, 원의 실정을 잘 모르는 고려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곡의 말을 믿은 것으로 보인다.
기거(起居). 지난번에 황궁에서 폐하를 뵙고 하직한 뒤로 한 해의 별이 벌써 하늘을 일주하였습니다. 신은 그동안 기자(箕子)가 봉해진 나라에 멀리 처하면서 항상 만년토록 장수하시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조령(詔令)이 우레처럼 행해지자 만방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덕음(德音)이 하늘에서 내리자 일국이 광채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사은(私恩)을 받고 보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부끄러운 심정이 더할 뿐입니다.
-『가정집』 제10권, 「표전」
이런 흐름은 고려말, 조선 초기 유학과 불교가 어우러진 구세력들과 대립하는 이념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력들의 생각은 그들 자신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을 부정하지 못하고 단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기자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자를 내세우면서 명나라에 보내는 공문에 늘 기자를 언급하자 명나라에서도 잘 몰랐던 기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런 관심은 결국 명의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서 기자사당을 안내해달라고 하기에 이르렀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한 말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평양에 기자사당을 만들게 되었다.
필자는 앞에서 간단하게 몽골의 다루카치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가 고려왕이 되었다가 명의 압력으로 나라 이름을 고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한 것은 당시 고려의 국조격인 단군조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지은 것이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자조선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권근이 지었고, 성석린이 교정을 한 이성계의 신도비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을 ‘환왕(桓王)’으로 추증을 한 것을 보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건국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어느 때부터인가 단군보다는 기자의 위치가 높아지고 커지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근거는 고려말 성리파들이 원에게 사대주의를 하면서 고조선의 옛 땅을 기자의 땅으로 둔갑시켜 단군보다는 기자를 앞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훗날 명으로 그대로 전해지면서 성리파들이 집권을 한 조선 중기부터는 조선을 기자의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은 사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식, 그리고 학문에서도 모두 바뀌어 한국의 역사는 자주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집권자들과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므로 조선의 역사를 연구할 때 비록 조선 중기 이후는 성리학이 큰 흐름인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조선시대사 연구에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