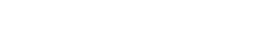한민족의 국통맥
「광개토태왕비문」과 『환단고기』의 정합성
1. 비문의 유래와 재발견
광개토태왕(생애. 374~412) 비(碑)는 고구려의 위대한 정복군주이며 경세군주였던 고구려 19대 왕인 광개토열제(재위. 391~412)의 업적을 그의 아들인 장수열제가 그의 사후 2년 뒤인 414년에 세운 공적비이다.
광개토태왕의 사후 정식명칭은 비석의 제1면에서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國罡上 廣開土境 平安好太王)’이라 하였고 제4면에서는 평안(平安)을 빼고 ‘국강상 광개토경 호태왕’이라 하였다. 국강상(國罡上)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강(罡)을 단순히 언덕강(岡)으로 해석하여 왕릉이 있는 장소 즉 ‘도읍인 국내성 언덕 위’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해석은 강(罡)은 북두칠성을 뜻하므로 ‘돌아가신 뒤 북두칠성이 되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광개토경(廣開土境)은 영토를 널리 개척하였다는 뜻이고 평안(平安)은 평천하(平天下)하고 안백성(安百姓)했다는 뜻이며, 호태왕(好太王)의 호(好)는 ‘위대하신, 훌륭하신’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위대하신 태왕님’으로 볼 수 있다.
이 비석은 청나라때 만주족이 자신들의 발상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봉금(封禁)정책을 실시하여 1880년경에 이르러 재발견 된다. 능비(陵碑)는 정면에서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며 4면에 모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제1면은 11행이고 제2면은 10행이고 제 3면은 14행이고 제 4면은 9행으로 모두 44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행은 모두 41자로 이루어져 44×41=1804자가 나오나, 제 6행만은 기사왈(其詞曰) 아래 2글자를 빼고 위로 올려 써서 총 1802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인터넷 또는 박물관 등의 공식 문서에 총 글자 수가 1775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2. 일제의 마멸과 「무술등본」
이 비문의 전문이 알려진 것은 일본 아세아협회(亞細亞協會)가 1889년에 발행한 『회여록(會餘綠)』 제5집에서였다. 이들이 참고한 자료는 일본 육군참모본부의 사코 가게아키(酒匂景信) 중위가 제공한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 능비 탁본이었다. 쌍구가묵의 쌍구(雙鉤)는 비문(碑文)이나 이미 탁본한 대본 위에 다시 종이를 대고 글자 주변을 선으로 그려 복사하는 것이고 가묵(加墨)은 선으로 그린 글자만 남기고 나머지 종이 면을 먹으로 칠해 탁본처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쌍구가묵본은 탁본하는 사람이 그 글자를 보고 나서 그 모양 그대로 그리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글자는 자의적으로 고치거나 가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탁본이 아닌 것이다. 이 가탁본(假拓本)은 요코이 다다나오(橫井忠直)의 해석과 함께 소개되었는데 명치유신 이후 조선침략을 노리던 일본은 마수의 손길을 뻗쳐 비문을 왜곡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글자를 마멸시키는 만행을 저지른다.
『환단고기』를 편찬한 운초 계연수는 1898년 5월 오동진, 이홍린 등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이덕수, 김효운, 백선건 등과 함께 탁본을 뜨는데 1802자 중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117자 뿐이었다. 그 뒤 1912년 5월에 다시 가서 탁본을 뜰 때에는 많은 글자들이 마멸되어 있었다. 계연수는 1898년에 뜬 탁본(이를 「무술등본」이라고 부른다) 내용을 바탕으로 ‘광개토성릉비문결자징실(廣開土聖陵碑文缺字徵實)’을 지어 그 사이 마멸된 138자를 복원하였다. 이 중 일본과 관련된 글자가 100여자가 넘고 특히 광개토태왕의 일본열도 정벌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마멸된 것을 보면 일본인들에 의해 태왕비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1931년 삼육사(三育社)의 회람잡지(回覽雜誌)에 계연수의 ’성릉비결자징실‘을 게재했다가 압수당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의 편집장 전봉천(全鳳天)은 도주하였고 삼육사는 해산되었으며 관련자들은 구속되었다.
3. 신묘(辛卯)년 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
먼저 해석이 다양한 신묘(辛卯)년 조에 대한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 以辛卯年 來渡海破 百殘 □□新羅 以爲臣民
1) 일본인들의 해석
먼저 일본 사람들의 끊어읽기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而倭가 以辛卯年에 來渡海하야 破百殘 □□新羅하고 以爲臣民이라(일본사람들은 □□을 가야로 해석한다)
왜가 신묘년(391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가야 신라를 격파하고 (백제, 가야, 신라를) 신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반도는 본래 4세기 말엽에 왜에게 격파된 나라이고 임나일본부가 있던 곳이라 하여 정한론(征韓論)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 첫째, 4세기 말엽 일본열도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어서 강력한 무력을 발휘할 힘이 없었다. 둘째, 광개토열제의 훈적을 기록하는 비석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없으며 셋째, 『삼국사기』 등 우리의 기록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은 일본의 교과서에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본의 박물관을 가보면 버젓이 이러한 해석을 전시하고 있다.
2) 중국인 왕건군의 해석
중국인 왕건군(王健群)도 『광개토왕비 연구(廣開土王碑 硏究)』에서 일본인들과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다.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다음의 말을 덧붙이고 있다.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臣民)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는 다만 하나의 과장한 말일 뿐 역사적 사실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왜는 당시에 결코 통일된 정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제와 신라를 침략한 왜는 다만 북구주(北九州) 일대의 약탈자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그들은 무리를 지어 해적의 방법으로 한반도 남부에 진입하여 살상과 약탈로 그곳 물건을 탈취했을 뿐이다. 소위 이위신민(以爲臣民)은 다만 일시적으로 압박하다가 즉시 떠나버린 것이지 결코 국가 사이의 통치 관계를 형성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도 □□의 글자를 알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해석한 것이다.
3) 정인보의 해석
1940년 정인보가 쓴 『광개토경평안호태왕릉비석략』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잔과 신라는 모두 태왕의 속민(屬民)인데 왜가 신묘년에 고구려를 처들어 오거늘 고구려 또한 바다를 건너가 격파하시었다. 백제가 왜와 밀통하여 신라가 불리(不利)하게 되거늘 태왕께서 (신라는 고구려의) 신민인데 어찌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친 것이다.
두 글자가 빠진 상태에서 정인보 선생의 해석은 탁월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모두 생략하고 빠진 2글자를 무술등본으로 보충하고 현토하여 정확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4) 「무술등본」에 의거한 해석
‘징실고’를 보면 □□은 연침(聯侵)으로 되어 있다.
百殘 新羅는 舊是屬民이니 由來朝貢이오.
而倭가 以辛卯年에 來渡海어늘 破하시고 百殘이 新羅어늘 以爲臣民이라하사
백잔과 신라는 옛적부터 우리 고구려에 예속된 백성들이니 과거부터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오거늘 이를 격파하셨다. 백잔이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침략하거늘 우리의 신하백성이라 여기시어…”
위의 해석의 특징은 첫째, 왜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석한 것으로 왜는 백제의 용병이 되어 수시로 한반도로 쳐들어와 고구려와 전투를 하였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고구려가 남쪽에 있는 백제 신라 가야를 건너 뛰고 바다를 건너 왜를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을 연침(聯侵)으로 해석하여 백제가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침략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셋째, 이위신민(以爲臣民)을 ‘고구려의 신민으로 여기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한문에서 ‘이위(以爲)’는 ‘…으로 여기다’라는 뜻이 있다. 신라를 고구려의 신민으로 여겼다는 해석은 이 구절의 첫 문장인 ‘백잔과 신라는 옛적부터 속민으로 조공을 받쳤다’라는 말과 수미(首尾)가 상합한다. 이위(以爲)를 ‘여기다’라고 해석한 것은 정인보 선생의 해석과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해석만이 ‘왜가 백제 (가야)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왜곡된 해석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정확한 해석이 된다. CE 399년 왜는 백제의 사주를 받아 다시 신라의 도성을 침범하는데 백제의 용병으로 활동하는 왜가 백제까지 격파하고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일본사람들의 해석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4. 광개토태왕 비문과 『환단고기』의 정합성
정합(整合)이란 ‘가지런하게 2개가 딱들어 맞는다’는 뜻이다. 광개토태왕 비문은 금석문이다. 금석문은 당시의 상황을 돌에 새겨서 기록한 것이므로 문서로 기록된 어떤 사료보다도 정확성이 뛰어나다.
『환단고기』에 대해 강단사학자들은 지엽적인 문구 등을 트집 잡아 위서로 매도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관을 답습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환단고기』의 내용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CE 414년에 새겨진 광개토태왕의 비문 내용이 『환단고기』와 정합한다면 『환단고기』가 진서(眞書)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필자는 10가지 방면에서 태왕비문와 『환단고기』의 정합성을 찾아내어 『환단고기』가 진서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1) 출자북부부여(出自北夫餘)
광개토태왕 비문의 첫머리는 “옛적 시조이신 추모왕께서 나라를 창건 하실 때에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에 出自北夫餘라)라고 하였다. 강단사학자들은 북부여를 나라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여를 기준으로 후세에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로 분파해 나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부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환단고기』의 「북부여기」를 보면 BCE 239년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하였고 BCE 58년 고주몽은 북부여의 7대 단군으로 등극하여 BCE 37년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게 된다.
5세기 전반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두루묘지명(牟頭婁墓誌銘)에서도 “하백의 자손이며 일월의 아들인 추모성왕께서 원래 북부여에서 나오셨다(河伯之孫이며 日月之子인 鄒牟聖王이 元出北夫餘라)”하였고 『삼국유사』에서는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전한서(前漢書)에 선제(宣帝) 신작(神爵) 3년 임술 4월 8일에 천제(天帝)가 홀승골성(紇升骨城)에 내려왔는데 오룡거(五龍車)를 탔다. 도읍을 세워 왕이라 일컫고, 국호를 북부여라 하였다” 등의 기록을 보면 고주몽성제가 나온 북부여는 국호가 확실하다.
『삼국유사』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한 BCE 239년을 BCE 59년으로 기술하여 3갑자 180년을 낮추어 잡아 단군조선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북부여 182년의 역사를 회복 불가능하게 왜곡시켰다.
2) 천제지자(天帝之子)와 모하백여랑(母河伯女郞)
태왕비를 보면 고추모를 “천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天帝之子시오 母는 河伯女郞이라)” 하였고 또 “나는 황천의 아들이오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我是皇天之子오 母는 河伯女郞이라)”고 하였다.
『북부여기』 <6세 고무서(高無胥)단군조>를 보면 고주몽이 동부여를 떠나 차릉수(岔陵水)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할 때 다리가 없자 강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하고 있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我是天帝子오 河伯外孫이라)
천제지자(天帝之子), 황천지자(皇天之子) 등은 중국에 예속되지 않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天下觀)과 천손민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들어 있다. 하백(河伯)은 송화강 주위의 땅을 다스렸던 지방 장관의 벼슬을 의미하는데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柳花夫人)이 하백의 따님이라는 것이 두 기록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3) 부란강세(剖卵降世)
태왕비에는 고주몽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셨다(剖卵降世)고 하였다. 이 난생설화(卵生說話)는 『위서(魏書)』 권(卷)100의 고구려전(高句麗傳),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卷)3 「동명왕편(東明王篇)」, 『삼국사기』 권(卷)13 <동명성왕 즉위년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환단고기』의 『북부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 해(BCE 79년) 5월 5일 유화부인이 알 하나를 낳았는데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이 아이가 바로 고주몽이니 골격이 뚜렷하고 늠름하며 위엄이 있었다(是歲五月五日에 柳花夫人이 生一卵하야 有一男子가 破殼而出하시니 是謂高朱蒙이시오 骨表英偉라)
정말 고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느냐의 진위를 떠나 태왕비와 『환단고기』의 내용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4) 노유부여엄리대수(路由夫餘奄利大水)
태왕비의 서두에 고주몽이 어머니 유화부인의 명을 받들어 동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갈 때 “도중에 부여의 엄리대수를 건넜다(路由夫餘奄利大水)”고 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엄사수(淹㴲水)라 하였고 『삼국유사』에서는 엄수(淹水), 『논형(論衡)』과 『후한서』에서는 엄사수(淹㴲水)라고 하였다.
『환단고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두 곳에 나온다.
차릉수(岔陵水)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 주몽이 물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졌다(行至岔陵水하사 欲渡無梁이라 … 始得渡어시늘 魚鼈이 乃解하니라)
이에 고주몽이 어머니 유화부인의 명을 받들어 동남쪽으로 달아나 엄리대수를 건너 졸본천에 도착했다(高朱蒙이 奉母柳花夫人命하사 東南走하사 渡淹利大水하시고 到卒本川이라)
태왕비의 엄리대수(奄利大水)와 『환단고기』의 엄리대수(淹利大水)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의 엄사수(淹㴲水) 『삼국유사』의 엄수(淹水)보다도 더욱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5) 전지십칠세손(傳之十七世孫)
태왕비에서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여 17세손인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에 이르셨다(傳至十七世孫 國罡上 廣開土境 平安好太王이라)”고 하였다.
광개토열제는 고구려의 19대 왕이며 고주몽으로부터 13세손(형제상속 5회)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의 학자들이 수많은 논문을 써서 각자 나름대로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속시원한 해답을 내린 자가 없었다. 『환단고기』를 보면 고주몽은 북부여의 건국자 해모수의 현손(4세손)이 되고 해모수의 사당을 지어 그를 태조(太祖)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해모수로부터 광개토열제까지가 4세+13세=17세손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환단고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6) 이구등조(二九登祚)
태왕비문에 광개토열제는 18세에 등극(二九登祚)을 하여 39세에 돌아가셨다(卅有九 晏駕棄國)고 하였다.
광개토태왕이 18살에 등극하였다는 기록은 『삼국사기』 등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환단고기』에만 그 기록이 보인다.
18세에 광명전에서 등극하실 때 예로써 천악을 연주했다(年十八에 登極于光明殿하시니 禮陳天樂이라)
이 한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는 대단히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7) 영락연호(永樂年號)
비문에서 “영락태왕이라고 불렀다(號爲永樂太王)”고 하였다. 영락은 광개토열제의 년호이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열제들의 연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환단고기』에는 고주몽성제(多勿, 平樂), 태조무열제(隆武), 광개토열제(永樂), 장수열제(建興), 문자열제(明治), 평원제(大德), 영양제(弘武), 보장제(開化) 등 9개의 연호가 보인다. 영락연호는 “영락10년(CE 400년) 삼가라가 모두 고구려에 귀속되었다(永樂十年에 三加羅가 盡歸我라)”라고 하여 광개토열제의 연호가 永樂임을 밝혀주고 있는데 오직 『환단고기』만이 이를 밝혀주고 있는 유일한 사서이다.
8) 급추지임나가라(急追至任那加羅)
태왕비를 보면 CE 399년 기해년(己亥年) 백제가 왜(倭)와 화통(和通)하여 신라를 공격하게 하자 신라는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CE 400년 경자년(庚子年) 광개토태왕은 전교를 내려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男居城)으로부터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니 왜적(倭賊)이 가득히 모여 있다가 고구려의 군사가 이르자 후퇴를 하였다. 고구려군이 “도망간 자취를 밟아 바다를 건너 등 뒤로부터 협공을 하면서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렀다(躡跡而越하야 夾攻來背하야 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이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는 후퇴하는 왜(倭)의 후미를 공격하면서 바다를 건너 대마도에 상륙하여 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이다. 지금의 강단사학자들 대부분은 여기의 임나가라(任那加羅)를 김해 가락국의 국성(國城)으로 보고 있다. “왜군이 경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김해방면까지 도망해왔다는 것은 왜군이 원래부터 임나가라의 지원에 의존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여 아직도 임나(任那)와 가야를 동일시하는 식민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단고기』에서는 임나에 대해 다음의 3가지로 정확하게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쪽에 있었는데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다. 둘째 대마도 두 섬이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되자 임나는 대마도 전체의 명칭이 되었다. 셋째 CE 400년 대마도가 고구려에 귀속되었고 대마도와 구주(九州) 그리고 주위의 10개 나라가 연정(聯政)을 폈지만, 임나 10국을 모두 고구려에서 직할(直轄)하였다.
임나 10국은 바다에 3국, 구주(九州)에 7국이 있었는데 이를 보면 임나의 명칭이 대마도를 넘어 구주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나가라의 종발성(從拔城)은 지금 대마도 동북쪽에 있는 악포(鰐浦)를 가리킨다.
@9. 광개토열제의 일본정벌
이 부분은 현재의 탁본에서 대부분이 마멸되어 있는데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의도적으로 훼손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다행히 「무술등본(戊戌謄本)」을 통해서 대부분이 복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큐슈 대우국의) 시라성과 도성(都城)을 함락시킬 때 왜적이 성에 가득했으나 왜적이 무너지니 성이 여섯 번이나 우리의 공격을 받고 탕멸하여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왜적이 드디어 나라를 들어 항복하니 죽은 자가 10명 중 8, 9명이고 모두 신하가 되어 이끌고 오니 안라인으로 지키게 하였다.(拔始羅城 都城할새 倭滿倭潰하니 城이 六하고 라 하니 九오 盡臣來하니 安羅人으로 戍兵 하니라)
이후 고구려의 좌군(左軍)은 담로도(淡路島)를 거쳐 단마(但馬)(효고현 도요오카시 주위)로 진격하고 우군(右軍)은 난파(難波)를 거쳐 무장(武藏)(긴키 동쪽의 도쿄, 사이타마현)에 도달하였다.
광개토열제가 일본열도에 상륙하여 일본을 정벌했다는 것을 기록한 사서는 『환단고기』가 유일하다. 『고구려국본기』를 보면 “한번은 바다를 건너 이르는 곳마다 왜인을 격파하였다(一自渡海로 所至에 擊破倭人이라)” 라고 하였다.
10) 안라인(安羅人)으로 수병(戍兵)
광개토태왕비에는 안라인(安羅人)으로 수병(戍兵)(군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했다)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온다. 첫째는 대마도의 종발성(從拔城)이 항복하자 안라인(安羅人)으로 수병(戍兵)케 했다고 하였고 둘째, 시라성(始羅城)과 도성(都城)을 공취(攻取)하고 안라인(安羅人)으로 수병(戍兵)케 했다고 했으며 셋째, 탁순(卓淳), 단마(但馬), 무장(武藏) 등을 취(取)하고 안라인(安羅人)으로 수병(戍兵)케 했다고 하였다. 안라인(安羅人)은 누구인가?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의 연구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안라(安羅)를 함안(咸安)으로 간주하여 과거에 일부 논자들은 임나일본부(任那日本部)의 용병(傭兵)으로 해석하여 왔다. 즉 왜가 장기간에 걸쳐 가야를 점령했다는 근거로서 이용하고자 했다.
㉡ 라인(羅人)을 신라인으로 보아 신라인을 안치하여 파수병(把守兵)으로 삼았다.
㉢ 라인(羅人)은 임나가라인(任那加羅人)으로 임나가라 사람을 안치하여 파수병으로 삼았다.
㉣ 고구려가 라인(邏人) 즉 순라병(巡邏兵)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안라(安羅)에 대해 『고구려국본기』는 명쾌한 대답을 내려 주고 있다.
(구주에) 안라국이 있었다. 안라는 본래 홀본(忽本) 즉 졸본(卒本)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안라국의 북쪽에 아소산이 있다. 안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가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안라는 임나 10국의 한나라이고 고구려에서 이주하여 고구려와 일찍부터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광개토열제가 일본을 정벌하고 그들에게 치안의 유지를 맡겼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광개토대왕 비문과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환단고기』를 통해 기존 강단사학계가 풀지 못하는 난제까지도 모두 풀어주는 보배로운 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