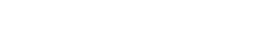한민족의 국통맥
『환단고기』와 『요사』를 통해서 본 대진국 5경의 위치
대진국은 고구려를 계승한 자주독립국가
중국에서는 대진국(大震國)을 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세운 나라이고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서 당나라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진국은 고구려를 계승한 한민족사의 정통 자주독립국가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대진국은 칭제건원(稱帝建元)하여 자체적으로 연호를 쓰는 독립국가였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였으며,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를 적대시하면서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해동성국(海東盛國)이었다. 일찍이 이유립은 ‘고구려정통론’을 제시하여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는 ‘원시고구려’, 고국몽성제가 세운 고구려는 ‘본고구려’, 대중상이 세운 대진국은 ‘중고구려’, 태조왕건이 세운 고려는 ‘후고구려’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의한 역사왜곡과 일본학자들의 강역 축소 그리고 이를 계승한 한국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본질이 밝혀지지 않고 해방이 된 지 근 80여 년에 이르기까지도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의 학자들이 쓰고 있는 발해라는 국호는 폐기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구당서(舊唐書)』의 기록에 의해 713년 당나라에서 낭장(郞將) 최흔(崔忻)을 보내 대조영을 좌효위원외대장군(左驍衛員外大將軍) 발해군왕(渤海郡王) 홀한주도독(忽汗州都督)에 제수함으로부터 국호를 ‘발해’로 고쳤다고 하고 있으나, 대조영은 국호를 ‘대진’이라 하고 연호를 ‘천통(天統)’이라 하여 칭제건원한 황제국가였지 결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 발해는 이후 중국의 문헌이나 외국인들에 의해 언급되었지만 공식 국호는 ‘대진’이었다.
삼신오제설에서 유래한 오경제
5경제(五京制)의 유래는 우리의 전통적인 삼신오제사상(三神五帝思想)에서 기원한 것이다. 『환단고기』의 『태백일사』에는 「삼신오제본기」가 있다. 삼신(三神)은 천일신(天一神)·지일신(地一神)·태일신(太一神)을 말하고, 오제(五帝)는 흑제(黑帝)·적제(赤帝)·청제(靑帝)·백제(白帝)·황제(黄帝)를 가리키며 동서남북 중앙을 구성하고 춘하추동을 다스리는 신(神)이시다. 삼신과 오제는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주재하는 궁극의 존재인데 이후 한국과 중국의 조직, 제도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배달국의 초대 커발환 환웅천황께서는 삼백[三伯 또는 삼한(三韓)] 오가(五加) 제도를 만들었으니,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의 조직과 우가주곡(牛加主穀) 마가주명(馬加主命) 구가주형(狗加主刑) 저가주병(猪加主病) 양가[羊加:일작계가(一作鷄加)] 주선악(主善惡)의 오사(五事)가 그것이다. 이것이 한민족의 조직과 제도의 근원이 되어 단군조선의 삼한관경제(三韓管境制)와 오가제도, 북부여 때 오가지병(五加之兵)을 분치하고 경향분수지법(京鄕分守之法)을 설치한 5부 제도로 계승되었다. 고구려 때도 이를 계승하여 삼경[三京: 평양성·국내성·한성(漢城)-황해도 재령] 5부제)가 있었는데, 5부는 소노부(消奴部)·절노부(絶奴部)·순노부(順奴部)·관노부(灌奴部), 계루부(桂婁部)였다. 신라에서는 삼국통일 이후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五小京)을 두었는데, 금관경(金官京:김해)·중원경(中原京:충주)·북원경(北原京:원주)·서원경(西原京:청주)·남원경(南原京:남원)이었다.
고려시대에는 3경(三京)을 두어 중경(中京)인 송악, 남경(南京)인 목멱양(木覓壤:현서울), 서경(西京)인 평양을 중시하였고 전시에 출정하는 군대는 좌군·우군·중군·전군·후군의 5군으로 편성하였다. 중국의 문화에 나타나는 삼황오제(三皇五帝), 삼진오성(三辰五星), 삼재오상(三才五常), 삼강오륜[三綱五倫, 삼강오상(三綱五常)], 삼산오악(三山五岳) 등은 삼신오제(三神五帝)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대진국의 5경은 바로 요(遼)의 5경과 금(金)의 5경 제도로 이어진다. 요나라의 5경은 상경임황부(上京臨潢府: 지금의 내몽고자치구 파림좌기(巴林左旗) 동남쪽 파라성(波羅城), 동경요양부(東京遼陽府: 길림성 요양시), 남경석진부[南京析津府: 북경(北京)], 중경대정부[中京大定府:지금의 내몽고자치구 영성현(寧城縣) 서남쪽 대명성(大明城)], 서경대동부[西京大同府:지금의 산서성 대동시(大同市)]이다. 금나라의 5경은 중도대흥부(中都大興府:지금의 북경)를 중심으로 상경회녕부[上京會寧府:지금의 흑룡강성 아성시(阿城市) 남쪽 백성자(百城子)], 동경요양부(東京遼陽府:길림성 요양시), 북경대정부[北京大定府:지금의 내몽고자치구 영성현(寧城縣), 대명진(大明鎭)], 서경대동부(西京大同府:산서성 대동시)), 남경개봉부[南京開封府:지금의 하남성 개봉시(開封市)]를 두었다.
유득공의 『발해고』에서의 5경 비정(比定)
혜풍(惠風) 유득공(柳得恭(1748~1807))은 『발해고(渤海考)』를 지어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크게 연구되지 않았던 대진국의 역사 연구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곳의 「지리고(地理考)」에는 5경의 위치를 비정하여 “발해 5경 제도를 보면, 상경 용천부는 지금의 영고탑이고, 중경 현덕부는 지금의 길림이고, 동경 용원부는 지금의 봉황성이고, 남경 남해부는 지금의 해성현이며, 서경 압록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압록강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용원부를 동경으로 삼고, 압록부를 서경으로 삼았다는 말은 의심스럽다. 봉황성 서쪽에 또 압록강이 있었다는 말이 되니, 요양에도 패수가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동경 용원부를 봉황성이라 하고, 서경 압록부를 지금의 압록강 유역으로 잡아 동경이 오히려 서쪽에 있고, 서경이 동쪽에 있다고 비정했으니 자기 스스로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서요하를 의미하는 압록강(鴨淥江)과 지금의 압록강(鴨綠江)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기호는 『발해고』가 1권 본과 4권 본이 있는데, 1권 본은 초고본이고 4권 본은 수정본으로 4권 본은 1권 본보다 35% 정도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표를 제시하고 있다.
| 《요사》 | 1권본 | 4권본 | 현재 |
상경 | (현 영안) | 영고탑 | 영고탑 | 영안 |
중경 | 요양, 즉 평양 | 길림 | 길림 | 화룡 |
동경 | 개주 (현 봉성) | 봉황성 | 경성 | 훈춘 |
남경 | 해주 (현 해성) | 해성현 | 함흥 | 북청 |
서경 | 녹주 (현 임강) | 압록강 근처 | 강계 동북 200리 | 임강 |
송기호(서울대 국사학과)는 4권 본 『발해고』에서 상경을 영고탑, 중경을 길림, 동경을 경성, 남경을 함흥, 서경을 강계 동북 200리의 압록강 건너편으로 비정하여 1권 본보다 더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여 중경을 길림성 화룡시 서고성(西古城), 동경을 길림성 훈춘시 팔련성(八連城), 남경을 함경남도 북청군 청해토성, 서경을 길림성 임강시(臨江市)로 보고 있는 지금 역사학계의 입장을 확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요사』에서 동경이 개주(현 봉성)라 하고 서경이 녹주(현 임강)라고 한 것은 진실을 왜곡한 자의적인 기술이다. 그가 주장하는 발해의 영토와 5경의 위치 그리고 천도 과정을 지도로 표시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 사학계의 5경 비정
1) 상경(上京) 용천부(龍泉府)
상경 용천부의 위치는 흑룡강성 목단강시[牡丹江市:지급시(地級市)], 영안시[寧安市:현급시(縣級市)] 발해진(渤海鎭)이다. 이곳에는 도성의 유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이설이 없다.
2) 중경(中京) 현덕부(顯德府)
중경 현덕부에 대해서는 처음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지금은 길림성 화룡현(和龍縣) 서고성(西古城)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추세이다. 서고성을 중경으로 잡는 중요 이유가 유물의 발굴도 있지만 정효공주의 무덤이 발굴된 것인데 정효공주(757~792)는 세종(世宗)의 넷째 딸로 36세에 졸(卒)하였다.
3) 동경(東京) 용원부(龍原府)
『신당서』 「발해전」에 “예맥의 고지(故地)를 동경으로 삼고 용원부라 하고 또 책성부라고 불렀다.”라고 하였고 “정원(貞元) 연간에 상경에서 동남쪽에 있는 동경으로 수도를 옮겼다.(貞元時에 東南徙東京이라)”라고 하였으며 “용원부 동남쪽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일본과 통하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김육불이 훈춘시 경내의 팔련성(八連城)을 동경 용원부의 소재지로 본 이후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설을 따르고 있으며 북한의 박시형도 이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근간에 북한의 채태형(蔡太泂), 장국종(張國鍾)은 함경북도 청진시 부거리설(富居里說)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4) 남경(南京) 남해부(南海府)
『신당서』 「발해전」에서 “옥저의 고지가 남경이고 남해부라고 부르며 옥주(沃州), 정주(睛州), 초주(椒州)의 삼주(三州)를 관할한다.”라고 하였고 “남해는 신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남해부의 위치도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함흥설(咸興說), 경성설(鏡城說:함경북도 청진 남쪽), 북청설(北淸說)로 압축된다. 함흥설의 주창자는 정약용(丁若鏞)이고 이후 와다 기요시(和田淸) 등이 주장하여 오랫동안 유력한 설로 자리 잡아 왔다. 함흥설도 함흥관내(지금의 영광군)로 보는 설과 오늘의 영광군과 함주군 경계에 있는 백운산성에 비정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담기양(譚其驤)의 『중국역사지도집』도 함흥을 옥주로 표기하며 이 설을 쫓고 있다. 경성설의 주창자는 마츠이(松井)인데 지금은 따르는 자가 거의 없다. 북청설은 김육불이 제기하였고, 이 설은 지금의 중국과 북한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한국의 학자들도 이를 쫓고 있는 추세이다.
5) 서경(西京) 압록부(鴨淥府)
『신당서』 「발해전」에서 “고구려의 고지가 서경이고 압록부라고 부르며 신주(神州), 환주(桓州), 풍주(豊州), 정주(正州)의 4주를 관할한다.”라고 하였고 “압록부는 조공도(朝貢道)이다.”라고 하였다. 가탐(賈耽)의 『도리기(道里記)』에 “압록강 입구로부터 배를 타고 100여 리를 가고 다시 작은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30리를 거슬러서 가면 박작구(泊汋口)에 이르니 발해의 국경이 된다. 또 5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주(神州)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5경의 위치 중에서 지금까지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동경과 서경이다. 동경의 경우에는 훈춘설과 청진 부거리설이 대립되어 있고 서경의 경우에는 임강설(臨江說)과 집안설(集安說)로 나뉘어 있다. 김육불은 『신당서』와 『도리기』에 근거하여 서경 압록부의 수주(首州)인 신주를 지금의 임강현(臨江縣)으로 비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 임강현성에서 발해 시기의 유물이 자주 발견되면서 여기서 성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금 학계에서는 임강진을 서경압록부와 수주인 신주의 소재지로 일치하게 인정하고 있다.
집안설의 요점은 과거 집안 국내성(國內城)이 고구려의 정치 중심지였고 비록 고구려 유적이지만 유적 내용이 모아산(帽兒山)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은 길림성 임강설을 지지하고 북한의 학자들은 집안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를 도표로 만들고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 및 한국 학자들의 주장 | 북한 학자들의 주장 |
상경 | 영안시 발해진 | 영안시 발해진 |
중경 | 화룡시 서고성 | 화룡시 서고성 |
동경 | 훈춘시 팔련성 | 청진시 부거리 |
남경 | 북청 청해토성 | 북청 청해토성 |
서경 | 길림성 임강시 | 길림성 집안시 |
『환단고기』와 『요사』를 통해서 본 대진국 5경의 위치
대진국 5경의 위치를 정함에 있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은 대진의 영토가 지금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북동쪽에 치우친 협소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요사』 「지리지」의 내용을 지금의 시각으로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경 용천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으므로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4경에 대하여 『환단고기』와 『요사』 「지리지」의 내용 그리고 장도빈의 주장을 중심으로 그 위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경 현덕부
중경 현덕부에 대해서 『환단고기』에서는 언급이 없다. 지금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돈화설(敦化說)에서 화룡시 서고성설로 귀결된 듯하다. 『요사』 「지리지」 <동경 요양부조>에 “요양은 옛날의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성이고 (대진국 때) 중경 현덕부”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중경 현덕부의 위치는 지금의 길림성 요양시이고 요양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연구자들은 이를 부정한다. 『요사』의 이 부분에 대한 교감기(校勘記)에서도 “본절(本節)은 요양이 평양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의 조문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원위(元魏)의 태무제(太武帝)가 사신을 보내 고구려왕이 머무는 평양성에 이르게 했으니 요나라의 동경이 본래 이곳이다.
----------------------------
이를 보면 427년 장수열제가 천도한 평양은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요녕성의 요양이 됨이 확실하다. 요양은 요나라 때 처음 남경(南京)이라고 부르다가 938년에 동경(東京)으로 개명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요양이 평양임을 증명하는 『원사(元史』 「지리지」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동녕로는 본래 고구려의 평양성이니 또한 장안성이라고도 부른다. 한나라가 조선을 멸하고 낙랑군과 현도군을 두었으니 이곳은 낙랑의 땅이다. 진나라 의희(405~418) 이후에 그 임금 고련(장수열제)이 처음으로 평양성에 도읍을 하였다.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수열제가 천도했던 평양이 요양시이고 요양은 대진국 때 중경 현덕부였고 요나라 때 동경 요양부였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2) 동경 용원부
『환단고기』에 동경 용원부의 위치는 명기(明記)하지 않았고 단지 4대 세종 광성문 황제가 즉위 후 바로 연호를 대흥(大興)으로 고치고 동경 용원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도읍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신당서』에서 동경 용원부는 또 책성부(柵城府)로 부른다고 하였다.
이유립은 장도빈(張道斌)의 『대한역사(大韓歷史)』를 인용하여 “동경 용원부는 고구려 때의 책성이니 오늘의 연해주 송왕령(보로실로프) 곧 해삼위(海蔘威)에서 북쪽으로 250리이다.”라고 하였고 장도빈이 말하기를 “고구려 책성유지에 발해가 동경을 두었는데, 지금도 연해주 니고리쓰크(송왕령)에 고적이 있어 발해동경유지로 주위 약 20리의 성지(城址)와 궁전지(宮殿址)가 있다.”라고 하였다.
1913년 장도빈은 송왕령성(宋王嶺城)을 답사하여 대진국의 동경자리로 추정하였다. 지금은 우수리스크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쌍성자(雙城子)라고 부른다. 1860년 ‘중러북경조약’에 의해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 쌍성자라는 명칭은 동쪽과 서쪽에 2개의 성이 있어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동쪽의 성은 부이단(富爾丹)이라 부르고 서쪽의 성은 주이근(朱爾根)이라 부르며 4리 정도 떨어져 있다. 9세기 중기에 쌍성자는 발해국의 중진(重鎭)이었다.
동성은 대진 때 축조되었고 서성은 금나라 때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송나라의 황제(휘종, 흠종)가 구금됐던 곳이라 하여 송황령(宋皇嶺) 또는 송왕령(宋王嶺)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1935년 스탈린의 측근인 국방인민위원 보로실로프의 이름을 따서 보로실로프로 개명했다가 1957년 우스리스크로 다시 개명하였다.
3) 남경 남해부
『환단고기』에서 “대진국 남경 남해부는 본래 옛 남옥저 땅인데 지금의 해성현이다.”라고 하였다. 『신당서』에서도 남경 남해부는 옥저 고지(故地)에 있다고 하였다. 남경 남해부의 위치를 요녕성 해성시라고 한다면 지금의 학자들이 함경도의 함흥, 북청으로 보는 것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남경 남해부가 요녕성 해성시에 있다는 것은 『요사』 「지리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
해주는 남해군이며 절도사가 있다. 본래는 옥저국의 영토이다. 고구려 때는 사비성을 쌓았는데 당나라 이세적이 이곳을 공격한 적이 있다. 발해에서는 남경 남해부라 불렀다.
-----------------
그러나 현 학계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오류라고 인식하고 있다. 구난희는 ‘『요사』 「지리지」로 본 요의 발해 지역 재편’이라는 글에서 “『요사』가 두찬의 비판을 받는 첫 번째 원인은 한 항목 내에 열거된 지명이 제각각이어서 지명 간의 지역 편차가 과도하다는 점에 있다. 발해를 다룬 지명에서도 허다하여 그 오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요사』의 기록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대진국의 영토를 축소시켜 보는 현 학계의 안목에 기인한 것이지만 옥저에 대한 몰이해도 한몫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유립은 일찍이 제 문헌을 검토하여 “동옥저는 함경도 대부분과 강원도 일대이고 북옥저는 장춘(長春)의 주가성자(朱家城子) 지역이고 서옥저는 연나부(椽那部) 부여(夫餘)가 있었던 요녕성 백랑산(白狼山) 일대이고 남옥저는 요녕성 해성과 그 남쪽인 요동반도가 해당된다.”라고 하였다.
4) 서경 압록부
『환단고기』에 “서경 압록부는 본래 옛 고리국(稾離國) 땅이고, 지금의 임황(臨潢)이다. 지금의 서요하는 곧 옛날의 서압록하이다. 그러므로 옛 기록[구지(舊志)]에서 말한 안민현은 동쪽에 있고 그 서쪽은 임황현인데, 임황은 뒤에 요나라의 상경임황부가 되었다. 바로 옛날의 서안평이다. (西京鴨綠府는 本稾離古國이니 今臨潢이오 今西遼河가 卽古之西鴨綠河也라. 故로 舊志에 安民縣은 在東하고 而其西는 臨潢縣이니 臨潢은 後에 爲遼上京臨潢府也오 乃古之西安平이 是也라)”고 하였다.
임황현은 지금의 내몽고자치구 적봉시(赤峰市) 파림좌기(巴林左旗) 임동진(林東鎭)이다. 『요사』 「지리지」 상경도(上京道)의 선화현조(宣化縣條)에서 “태조(太祖, 야율아보기)가 압록부(鴨淥府)를 격파하고 백성들을 모두 옮겨 서울의 남쪽에 살게 했다.”라고 하였고 “녹주(淥州)는 압록군(鴨淥軍)으로 절도사를 두었다.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발해가 서경(西京) 압록부(鴨淥府)라고 불렀고 신주(神州), 환주(桓州), 풍주(豐州), 정주(正州)의 4주(州)를 모두 감독했다.”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녹주(淥州)는 요나라의 수도였던 상경(上京) 임황부(臨潢部) 근처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연구자들은 서경 압록부를 길림성 임강시(臨江市)에 비정한 후 녹주까지도 이곳으로 옮겨놓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압록(鴨淥)이라고 쓴 글자를 지금의 압록강인 압록(鴨綠)으로 오인해서 생긴 것들이다. 이전에 압록(鴨綠)은 지금의 압록강을 일컬었고 압록(鴨淥)은 요하 또는 서요하를 말했다는 것이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또 압록(鴨淥)을 압록(鴨綠)이라고 혼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한택 교수가 「고려 서북 국경에 대하여[요·금 시기의 압록(鴨淥)과 압록(鴨綠)을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삼국유사』에서도 “고구려는 안시성(安市城) 일명 안정홀(安丁忽)에 도읍을 정하였는데 요수(遼水)의 북쪽에 있다. 요수는 일명 압록(鴨綠)이라고도 하며 지금은 안민강(安民江)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문헌적인 근거도 없이 5경을 비정하기 보다는 문헌에 있는 내용을 우선 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걸음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사료된다.
상경 | 영안시 발해진 |
중경 | 길림성 요양시 |
동경 | 러시아 우수리스크(쌍성자) |
남경 | 길림성 해성시 |
서경 | 내몽고자치구 적봉시 파림좌기 임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