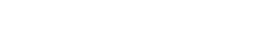한민족의 국통맥
한일 고대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가야의 역사
가야의 건국과 건국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가야의 건국 시기를 공히 CE 42년[후한(後漢) 건무(建武) 18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김유신이 원조(遠祖, 김해 김씨 시조) 김수로의 후손임을 기록하였고, 『삼국유사』는 「가락국기」를 인용하여 가야 건국 시기를 전하고 있다. 건국의 주체는 김수로왕과 다섯 형제로 기술하고 있다.
5가야≪가락기찬(駕洛記贊)≫에 의하면 “한 가닥 자줏빛 노끈이 드리워 여섯 개 둥근 알을 내리니 다섯 개는 여러 고을(各邑)로 돌아가고 한 개가 이 성 안에 남았다.”라고 하였다. 즉 한 개는 수로왕(首露王)이 되고 남은 다섯 개는 각각 가야의 임금(主)이 되었다는 것이니, 금관(金官)국을 다섯 숫자에 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 『삼국유사』 「기이」<5가야(五伽耶)조>
가야 건국은 난생설화를 바탕으로 기록하였는데, 김수로왕과 다섯 형제들이 천명(紫纓)을 받아 구지봉에서 9칸의 영역을 통합하여 가락국을 건국하는 내용이다. 당시 이 지역은 각기 소국의 9칸들이 다스리는 영역이었는데 김수로 다섯 형제들이 추대를 받아 가야가 건국되는 것으로 기록하였는데 결국은 강력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김수로와 형제들이 이 지역을 통합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벽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한 군신(君臣)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에 아도간(我刀干)·여도간(汝刀干)·피도간(彼刀干)·오도간(五刀干)·유수간(留水干)·유천간(留天干)·신천간(神天干)·오천간(五天干)·신귀간(神鬼干) 등 아홉 간(干)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후한(後漢)의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 3월 계욕일(禊浴日)에 살고 있는 북쪽 구지(龜旨)에서 이상한 소리가 부르는 것이 있었다. 백성 2, 3백 명이 여기에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 같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숨기고 소리만 내서 말하였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아홉 간(干) 등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구지입니다.” 또 말하였다. “황천(皇天)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여 이런 이유로 여기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라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게 될 것이다.”
구간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합(金合)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 - 『삼국유사』 「가락국기」
여기서 많이 알려진 것이 ‘구지가(龜旨歌)’라고 알려진 거북이를 부르는 노래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북이를 찾는데 뒤에 여섯 둥근 알이 내려오고 여섯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 앞 뒤가 맞지 않는 풀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향가 해석에서 ‘구하구하(龜何龜何)’를 한자 그대로 ‘거북아 거북아’로 풀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구지봉 자체가 지역민의 소도(蘇塗)였고, 여기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복골 점(占)을 치는 신성한 장소였다. 그렇기에 최근 향가 연구가(김영회, 도명섭)들은 이 부분을 거북이로 풀이해서는 안 되고 고대 제천의식과 결부시켜 본다면 ‘거북이’로 해석하는 것보다 등껍질로 점을 치는 “갈라질 균(龜)”으로 향가를 번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껍질이 갈라지는 점을 통해 이 지역을 이끌어나갈 천명을 받은 지도자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풀이해야 이후 김수로와 다섯 형제들의 출현에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이 향가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가야로 이루어진 가야제국
가야 건국이 당시 고구려·백제·신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김수로와 다섯 형제가 6개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서의 기록은 김수로가 가락국의 왕이 되고 나머지 다섯 형제는 다섯 가야를 만들어 해당 가야의 주(主)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를 연맹체 국가로 해석하고 있다. 각기 왕을 칭하되 총왕(總王)은 가락국의 왕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가야는 건국 시기부터 6개의 가야가 서로 간의 경쟁이나 투쟁 자체가 없이 하나인 듯한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졌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는 김수로왕이 등장하는 구체적 기록이 있는데, 이후 나머지 가야기록은 6가야의 어느 가야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
6가야의 위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에 정확히 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가야이름 | 위치 |
가락국(금관가야) | 김해(金海) |
고녕(古寧)가야 | 함녕(咸寧), 현 상주 함창지역 |
성산(星山)가야( 벽진(碧珍)가야) | 경산(京山) 혹은 벽진(碧珍), 현 성주지역 |
대가야(大伽耶) | 고령(高靈) |
아라(阿羅)가야 | 함안(咸安) |
소가야(小伽耶) | 고성(固城) |
그런데 이러한 6가야 중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김해 가락국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의 가야 고분군으로 고녕가야와 성산가야 고분군이 배제되어 많은 지적을 받았다. 고녕가야는 대일항쟁기 일본이 학자들이 그 존재를 부정함에 따라 광복 후 그 학맥들에 의해 현재까지 철저히 부정당한 결과이고, 성산가야는 해당 가야고분군에서 신라유물이 많이 출토된다는 이유로 가야문화에서 배제하려는 학계일부의 주장으로 인한 것이다. 대신에 대가야 영역의 창녕 비화가야 고분군이 등재되었고, 남원과 합천의 가야고분군을 별도의 국가로 주장하며 『일본서기』 임나 지명인 ‘다라’와 ‘기문’으로 등재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일본서기』 지명은 삭제되었으며, 합천고분군은 “쌍책지역가야정치체”로 남원은 “운봉고원 일대 가야정치체”로 표기되어 등재되었다. 『일본서기』 지명으로 등재 시도는 광복 후 친일매국 사학이 아직도 한국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삼국사기』 「지리(地理)」 ‘신라(新羅) 고령군편’에는 고녕가야가 상주 함창지역에 존재했다는 자세한 기록이 전한다.
일본지역의 가야 개척역사를 직접 찾아 연구한 사람들은 한반도 남부에 6가야가, 일본열도에 6가야가 존재했다는 12가야 주장도 나왔다. 국내 학자들이 주장하는 12가야는 『일본서기』 임나 지명을 비정하기 위한 우륵의 12곡을 가야 12국으로 비정한 일본인 학자의 주장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6가야의 건국자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김수로왕의 가락국과 대가야의 왕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나머지 국가에 대한 기록은 전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소가야의 후손이 과거 가야사의 기록을 모아 남긴 『육국가야사실록(六國伽倻事實錄)』에는 아래와 같이 6가야의 창업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야이름 | 건국자 |
가락국 | 수로왕(首露王) |
고녕(古寧)가야 | 고로왕(古露王) |
성산(星山)가야( 벽진(碧珍)가야) | 벽로왕(碧露王) |
대가야(大伽耶) | 대로왕(大露王) |
아라(阿羅)가야 | 아로왕(阿露王) |
소가야(小伽耶) | 말로왕(末露王) |
위의 기록은 기록에서 머물지 않고 있다. 해당 국가 지역의 수많은 고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명확한 역사적 존재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가야의 영역
6가야의 영역은 어디일까를 살펴보면 특이한 것을 살필 수 있다. 6가야 제국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국가에서 강을 끼는 것은 필수인데, 가야는 낙동강 수계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장악하고 있다. 낙동강은 본래 황강이라 불러왔는데, 가야제국이 들어서면서 ‘가락의 동쪽 강’이란 의미로 ‘낙동(洛東)강’이라고 불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가락국기」에는 가야영역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남원 운봉과 장수지역, 임실지역에도 가야고분이 발굴되고 전남 순천지역까지 고분과 유적이 발굴되어 가야의 영역이 대단히 넓게 분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東以黄山江, 西南以濸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而為國尾.
동쪽은 황산강(黃山江), 서남쪽은 창해(滄海), 서북쪽은 지리산(地理山), 동북쪽은 가야산(伽耶山)이며 남쪽은 국미 - 『삼국유사』「가락국기」
위의 「가락국기」 기록은 낙동강 전역과 서남쪽은 남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그리고 남으로는 국미까지 그 영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남쪽의 끝인 ‘국미(國尾)’를 현 사학계에서는 ‘나라의 끝’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료의 기록은 모두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국미’ 또한 지역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미란 지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명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 존재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태백일사』「고구려국본기」이다. 「고구려국본기」에는 임나를 언급하면서 국미는 대마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가야는 낙동강과 주변 남강, 섬진강 수계를 활용하여 영역을 확장했으며 대마도의 서북쪽에도 진출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가야사학계가 가야의 영역을 대가야와 김해가야 정도의 낙동강 수계와 섬진강, 남강 수계를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수많은 가야 고분들, 도굴의 실습장으로 전락
사국시대를 풍미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 가장 많은 고분을 남긴 국가는 당연히 가야인 듯하다. 낙동강 주변과 가야의 진출 영역에는 여지없이 가야고분군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 4세기에 접어들면서 가야는 주변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고분군을 구성하는데, 그 모습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릉을 활용하여 산등성이부터 아래까지 고분을 조성하는 방식의 고분 형태다. 신라가 생활지 주변 평지 지역에 고분을 조성하는 것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방식의 고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기록에 언급된 가야지역에는 여지없이 고분이 존재하고 있는가? 당연하다. 그것도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하여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원된 고분군은 전체 고분수의 10% 정도도 될지 모르겠다.
거의 대부분의 가야고분군은 방치되었고 도굴범들의 실습장으로 활용될 정도로 무주공산의 보물창고였다. 가야사학계가 부정하는 상주 함창지역의 가야고분군은 도굴범들이 동네에 들어와 살면서 계속 도굴해 온 유물을 오랜 시간 리어카로 실어 나가는 모습을 직접 주민들이 보았다고 한다. 지역 시장이 열릴 때면 수많은 가야토기와 가야의 칼도 길가에서 매매될 정도였다고 한다.
철기로 대표되는 가야문화
가야문화는 철기문화로 대표된다. 가야의 철정은 주변국이 수입해 쓸 정도로 발전된 제철기술로 철기를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는 섭씨 1000도 전후의 화력으로 연철을 만들어 단철(鍛鐵)로 만든 방식이 활용되었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초강법(炒鋼法)을 써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락국의 김해철산, 대가야의 야로철산(冶爐鐵山:합천군 야로면), 황산철산(黃山鐵山), 척지산철산(尺旨山鐵山:산청군), 모대리(毛臺里) 사철광(沙鐵鑛) 등과 아라가야 주위에는 대곡철산(大谷鐵山), 창원철산(昌原鐵山), 소가야의 고성(固城)에는 천성철산을 중심으로 철의 생산이 활발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초의 전래 불교는 가야불교
한국불교의 전래 시기는 고구려는 소수림왕(372년), 백제는 침류왕(384년)에, 신라는 법흥왕(527년)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교는 모두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럼 가야불교의 전래 시기는 언제일까? 가야에 불교와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은 여러 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인도불교의 도래를 상징하는 파사석탑은 허황후가 가야로 오면서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배에 싣고 온 신비한 석탑이다. 지금은 탑신은 없어지고 남아 있는 돌을 쌓아놓은 모습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금관성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然于時海東未 有創寺奉法之事. 蓋像敎未至而圡人不信伏, 故本記無創寺之文”
위의 기록으로 본다면 가야불교는 CE 48년에 전래 된 한국 최초의 불교가 된다. 그런데 한국학계에서는 말(末)이 아니라 미(未)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현재까지도 가야불교가 없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해 명월사 사적비에는 김수로왕은 삼원당(三願堂)을 창건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흥국사(興國寺), 황후를 위해서는 진국사(鎭國寺), 왕자들을 위해서 신국사(新國寺)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숭선전지』에는 「가락국기」를 인용해 김수로왕이 현재 삼랑진의 천태산에 아버지를 위해 부암(父庵)을, 무척산에는 어머니를 위해 모암(母庵)을, 자암산에는 자녀들을 위해 자암(子庵)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부암이 있던 절터에는 부암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찰에는 당시 인도에서 가져온 인도문화 시바신을 상징하는 요니가 보관되어 있어 더욱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 준다. 이를 볼진대 한국불교의 첫 전래는 가야불교임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현재 가야 관련 사찰이 김해를 중심으로 32개가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가야의 역사가 많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가락국기」가 남아 있었다면 많은 기록이 있었을 것이다. CE 42년에 건국된 가야는 CE 532년 구형왕이 신라와의 전쟁을 피해 나라를 신라에 바침으로써 역사 속에 사라진다. 가야는 연맹체국가이기에 총왕이 있는 금관국이 항복함으로써 나머지 5가야도 같이 역사 속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 월광은 월광사를 지어 나머지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가야왕조에 꿈을 잃지 않았던 세력들이 562년 다시 일어나 보지만 막강한 신라군 앞에서 항복함으로써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후 구형왕의 증손자 김유신이 신라에서 삼한일통을 이루는 공을 세워 ‘개국공(開國公)’으로 작위를 받았고 ‘흥무대왕(興武大王)’에 추존되었으니 500여 년 가야 역사는 영원히 역사에 전해지게 되었다.
오랜 역사의 가야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가야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다. 철의 왕국 가야가 왜 그리 쉽게 역사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것이다. 가야는 너무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해의 바닷가 근처 초선대(招仙臺)는 가야인들의 이동 경로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을 찾아 안내 간판을 보면 ‘거등왕이 칠점산의 선인(仙人)을 초대하여 거문고와 바둑을 즐겼다’는 안내문이 떡하니 서 있다. 가야사 왜곡의 현장인 것이다.
초선대는 가야 건국자인 김수로왕의 딸과 두 번째 왕인 거등왕의 아들 선(仙)에 관한 역사가 숨 쉬는 곳이다. 역사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거등왕의 아들 선이 세상의 쇠폐한 모습에 실망하여 신녀(神女)와 함께 가야 땅을 떠나 왜 열도로 건너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등왕이 강가의 바위에 올라 떠나간 아들 선을 부르며 아들 모습을 바위에 새겼다는 것으로 ‘아들 선(仙)’을 불렀다고 해서 초선대라고 한다.
일본학자들은 선과 함께 건너 온 신녀를 김수로왕 딸로 추정하는 묘견공주 혹은 왜 열도 최초의 통일여왕으로 정사에 등장하는 히미코(卑彌呼)로 인식한다. 강력한 철기문화를 가지고 왜 열도로 와서 평정할 정도의 가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야사 복원에 지원이 필요
가야 역사의 진면목을 드러내려면 우선 낙동강 영역에 방치된 수 천기의 고분과 관련 발굴 작업과 복원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일본 열도 속의 가야 유적도 다시금 연구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정부가 나서서 가야사 복원이란 이름 하에 10년간 1조 2천억을 조성하여 가야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역행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 자금으로 가야를 임나로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 천기의 가야고분은 지금도 파헤쳐진 채 낙동강의 산야를 덮고 있다. 진정한 가야사복원은 ‘있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유적 유물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다. 당당히 한국사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500여 년 가야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차원에서 관심과 역사복원 사업에 대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